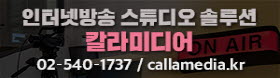하필(何必)이면 ‘사람’은 ‘사랑’인가?
.jpg) ‘사람’과 ‘사랑’은 글자가 비슷하고 발음이 어찌 그리 닮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하여 ‘사람’과 ‘사랑’이 두 단어가 “하필이면 사람은 사랑인가”를 알고 싶다. 사람과 사랑사이에는 피치 못할 관계를 알게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입 모양을 다물게 되고 ‘사랑’을 발음하면 입 모양이 열리게 되어 있다. 사람이 산다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내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음을 알게하고 외면으로는 그 형상이 ‘사랑’으로 나와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에 기준을 두고 필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여 꼭 그렇게 하라는 생각으로 입을 다물고 사랑을 내어서 해 본다. “하필이면 ‘사람’은 ‘사랑’인가?”를 알게 한다. 그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그 물음의 답이 외면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람이 겪는 삶의 문제의 답은 먼저 내 안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 그 것은 사랑이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인 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 의미를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는 삶이다. “하필이면 ‘사람’은 ‘사랑인가’?” 물음의 아마도 대화로 시작되는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과 ‘사랑’은 글자가 비슷하고 발음이 어찌 그리 닮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하여 ‘사람’과 ‘사랑’이 두 단어가 “하필이면 사람은 사랑인가”를 알고 싶다. 사람과 사랑사이에는 피치 못할 관계를 알게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입 모양을 다물게 되고 ‘사랑’을 발음하면 입 모양이 열리게 되어 있다. 사람이 산다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내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음을 알게하고 외면으로는 그 형상이 ‘사랑’으로 나와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에 기준을 두고 필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여 꼭 그렇게 하라는 생각으로 입을 다물고 사랑을 내어서 해 본다. “하필이면 ‘사람’은 ‘사랑’인가?”를 알게 한다. 그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그 물음의 답이 외면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람이 겪는 삶의 문제의 답은 먼저 내 안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 그 것은 사랑이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인 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 의미를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는 삶이다. “하필이면 ‘사람’은 ‘사랑인가’?” 물음의 아마도 대화로 시작되는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19 세기 사실주의에(realism)에 대한 반발이 20세기 전반 모더니즘(modernism)이었고 다시 이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생겨 산업사회는 분업과 대량생산으로 수요(需要)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말한다. 즉 컴퓨터, 서비스산업 등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공급이 넘치며 광고와 패션에 의해 지나친 소비문화에 온통 젖어 오늘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시대를 관찰해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삶은 인간의 비극을 보게 한다. 그 삶은 점진적으로 서로 경쟁에 돌입한 세 가지 가치체계를 물려받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 민주주의의 도덕, 절대 자유주의의 이념이라고 한다. 사랑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참된 진리, 선한 가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오늘에서 성서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혼이 필요함을 알게하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役事)이다.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인자는 우리를 위해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 보이신다. ‘사람’과 ‘사랑’의 차이는 받침 하나 차이다. ‘사랑’의 받침에 ‘ㅇ’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고 사람과 사물 사이를 이어주는 줄이다. 사람과 사랑의 받침 하나 차이는 ‘사람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않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의 삶의 길은 사랑으로 통한다. 일찍이 공자는 ‘인(仁)이 인(人)이라는 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仁(어진)이요’ 하였고 다산 정약용도 인(仁=人+二)이란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仁者二人相與也) 이라 했다. 삶이 고해의 바다라면 사랑은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배라 한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을 두고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랑의 화석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흔적들을 알게 한다. 사랑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침(재채기=해수咳嗽)의 공통점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한 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이다. 사람에게서 생명의 무게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이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 중에 온전히 나만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나의 곁에 있어준 친구, 나와 함께 걸었던 동료들과 이웃들…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경험과 추억 그리고 그들이 준 애정이 지금의 나에게 올올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그들과의 추억과 그들의 애정을 함께 버리는 일이다. 내 생명의 무게에는 내가 받아온 사랑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허무하게 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그래서 하필 사람은 사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