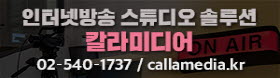오늘날 경청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공감하면서 진지하게 들을 줄 아는 ‘기법’으로 발전하여, 상담사, 교육가, 의료인이 훈련을 통해서 익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경청술(傾聽術)을 익힌 전문가가 되었노라면서도, 상대에 공감하는 대신 충고와 판단 비판을 일삼게 되는 것은 왜일까? 경청(傾聽)이 경청(敬聽)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상대를 ‘고장 난 마이크’ 쯤으로 인정해버리는 습성에 젖어 있어서가 아닐까.
M. 엔데의 동화 <모모>는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소녀의 이야기. 철학자 데이빗 로이와 문학교수 린다 굿휴는 <모모>가 “20세기 후반에서 가장 주목 받아야 할 소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1973년에 출간 되었으면서도 ‘오늘날의 악몽적인 상황’을 가장 잘 예언한 작품”이라 평가했다. ‘오늘날의 악몽적인 상황’이란 각박해진 인성과 함께 소통기술 발달의 역작용을 염두에 둔 것일지도 모른다.
<모모>에서, ‘시간저축은행’의 직원 회색 사나이들이 시간을 훔쳐 가버리자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진다. 그러자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방법으로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이상한 능력을 가진 소녀 모모가 나서서 시간을 되찾아 준다는 이야기에서, 독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대목은 모모에게 상담 해본 사람들이 경청하는 모모에게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장면이다. 에리히 프롬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피로를 느끼기 보다는 스스로의 의식이 뚜렷해지고 난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쾌적한 피로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했는데, 들어주는 쪽도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웃에 모모와 같은 사람이 왜 없겠는가.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따금 적당한 질문으로 응답해주는 그런 사람 말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모모의 들음은 기다림”이라고. 기다림이란 상대의 존재를 마음속에 담아두면서도 응답을 재촉하거나 제멋대로의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몸짓이란다. 상대의 페이스에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 기다림이란다.
“나도 모모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모모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고 그게 쉬운 노릇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터. 이쪽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나의 시간에 끼어들려 하거나, 나의 관심을 독점하려 드는 그런 이웃을 공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니 그럴수록, 그런 친구에게 지극히 작은 공감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나로 하여금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값진 일을 하게 했다는 보람을 안겨 주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충실감을 가져다주는 일이 그런 일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웃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는 흔하디흔한 다수 중의 하나가 되는 대신, 스스로 그의 소중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그렇게 우쭐해져 보는 나는 혹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하지만, 나의 나르시시즘이 소중한 나의 이웃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야...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서는, 잡스의 연인이 여태까지 잡스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으면서도 한편 자신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읽을 수 있다. 잡스의 애인이 잡스를 나르시시스트로 인정했듯이 그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나르시시스트일 것이고, 또 그런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같아 마음이 흐뭇해진다.
enoin34@naver,com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