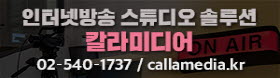게임(game)에는 플레이어가 서로 협력하는 게임과 협력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게임이론”을 논하는 이들은 전자를 “협력게임”, 후자를 “비협력게임”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치킨 게임은 비협력게임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다는데, 1950년대 미국 켈리포니어의 젊은이들이 즐기던 폭주족끼리의 깡다구(배짱) 겨루기에서 그 원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임스 딘이 주연한 1955년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은 치킨 게임의 발생신화를 보여주는 영화였던 셈이다. 치킨 게임이란, 중앙에 흰 선을 그어 놓은 직선도로상에서 수백 미터 거리를 사이하고 마주선 2대의 승용차가 신호와 동시에 액셀을 밟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는 게임. 어느 쪽이 되었든지 중앙선에서 벗어나면 패자가 되고 겁 없이 완주한 쪽은 승자가 된다. 불과 수초 내에 정면충돌 할 위험이 닥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쪽 하나가 선을 벗어나 상대를 피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참사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쪽은 치킨(chicken=겁쟁이)이 된다는 것이 치킨 게임의 룰이다.
상대가 계속 달릴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쪽 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선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반대로 이쪽이 계속 달린다면 상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 또한 피하는 길 뿐이다. 다시 말해서 치킨 게임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은 한 쪽이 달리고 다른 한 쪽이 피하는 길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 양편 모두가 달려서 정면충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결말이 되기 때문이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위 “나쉬의 이론”을 따르면, 어느 쪽이 달리고 다른 쪽이 피하는 균형적인 해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이 달리고 어느 쪽이 피하느냐이다. “나쉬 이론”도 그 언저리에서 머물지 더 이상은 파고들지 않고 있단다. 그러나 묘하게도 현실적인 치킨 게임에서는 이성적이지 않는 주자가,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달리는 쪽이 이득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
이제 막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차에 올라 앉아 액셀을 밟으려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맞은편 플레이어가 핸들을 뽑아 창밖으로 내던지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자. 그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때, 피하는 쪽은 이성적인 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는 쪽이 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서 가장 합리적인 균형이란 어느 편이 되었든지 상대 차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할 수밖에 없도록 위협하기 위해 가장 비합리적인 전략을 취하는 노릇이 되는 셈이다. 뒤집어 놓고 보면 이성을 버리는 쪽이 이성적인 결단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성적인 사람의 눈에는 선을 벗어나서 패자가 된 쪽 만이 치킨이 아니라, 게임에 참여한 양쪽이 모두 치킨으로 보일 터이지만 말이다.
치킨 게임이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일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두 게이머가 죽게 되는 결과가 되지만, 사회적 치킨 게임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아무도 희생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말이다.
내 눈에는 치킨 게임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정치 게임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에게 “왜 치킨 게임에 몰두하느냐?”하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다. “정의를 위해서!”... 맞은편 게이머는 정의를 저해하는 자라는 편견에다, 그와 맞서고 있는 자신은 최악의 경우 의사(義士)나 열사(烈士)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더해진 확신의 소유자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주>에서 말했다. “억압된 적의(敵意)나 질투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합리화를 거쳐 변형된 모양으로 표현 된다. 적의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를테면, “도덕적 분노”이거나 “정의라는 가면을 쓴 공분(公憤)”이 되기도 한다. 또 말했다. “적의가 합리화된 또 하나의 표현은 양심이라든가 의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enoin34@naver.com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